한영자 작가는 6 25 전쟁으로 한글 터득이 늦어졌다고 한다. 국군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던 세대다.
커다란 시련없이 맑은 심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듯하다.
안과의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며 느낀 점과 개업후 만난 환자들 이야기, 특히 어린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겹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음악과 그림에도 심취한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모습이 그려진다. 꽃이 피면서 내는 소리를 듣는 이의 아름다움이 있다. 복된 삶을 편안하게 바라보았다.
* 만나는 분들은 내면에 이미 문학, 음악, 미술 옷을 두르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면서 멘토가 되고 겉옷을 한 벌 씩 내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마음을 보이면서….
글, 그림, 노래가 부르는 손짓을 외면하지 않고 내면을 넓혀나갔다. 커진 그릇에 진료의 아픔도 담게 되었다.
<작가의 말> 중에서
* 나는 이따금 눈병 환자를 치료한다기 보다 말이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진찰 받으러 온 사람에게 말을 하면서 당황할 때가 생기기 때문이다.
"눈이 어때서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눈이 가려워서 왔어요."
'그게 아니라'라면 나는 무어라고 물어야 할까? 한두 사람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어디가 틀린 물음인지 생각을 해보며 묘안이라도 배우려고 다시 묻는다.
"그게 아니라면 무어라고 물어야 하나요?"
(62쪽)
* 압구정 지하철역의 계단을 내려가 승강장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구파발 가는 쪽인가요?"
"맞아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근처에 있는 아가씨가 대답을 했다. 눈을 꼭 감은 아주머니가 흰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난 병원에서 진료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무엇에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
짧은 시간 동행하면서 보는 사람이 볼 수 없는 감은 눈이 보는 것을 잠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약간의 혼동을 거친 후 제 길을 찾아갔다. 한 층을 더 올라가 점형 점자블록의 안내를 따라 장애인 화장실 앞에 섰다. 문 앞에 서서 '열림'이라는 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자들을 만지니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후에 알았다. 여자 장애인 화장실은 조금 더 들어가 있었다. 볼일을 마친 후 나왔다. 계단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는 지팡이로 계단마다 짚고 잘 걸었다. ...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보고 싶으세요?"
"아들이요."
"결혼하셨군요?"
"남편은?"
"내 속만 썩이다가 죽었어요."
그녀의 마음을 검은색으로 물들이고 싶지 않았다.
"점심은 잡수셨어요?"
"아뇨."
"국가가 주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 종일 굶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 멀었어요."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언제 충족한 복지 국가가 될까?
"돈의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돈의 기장이 달라요."
그때 우렁찬 소리를 내며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집까지 동행을 고집하지 못했다. 급히 가방을 열어 한 장 있는 고액권을 꺼내 반으로 접어 손에 쥐어 주었다. 싫다고 사양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눈 표시로 받으라고 했다. 하얀 미소가 아름다웠다.
먼 순례자의 길을 바라본다.
(115쪽)
* 머리를 들고 아래 눈꺼풀 가운데를 열어 안쪽 불그레한 부분과 연결된 흰자위 사이에 안약을 한방울 넣고 2분간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뜨라고 일러 주었다. 이렇게 점안하면 분실되는 안약이 적다. 처음 알았다고 기뻐하면 웃는다. 내가 아는 사소한것을 교환하며 작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즐겁다. 몇마디 말 인심에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린다. (2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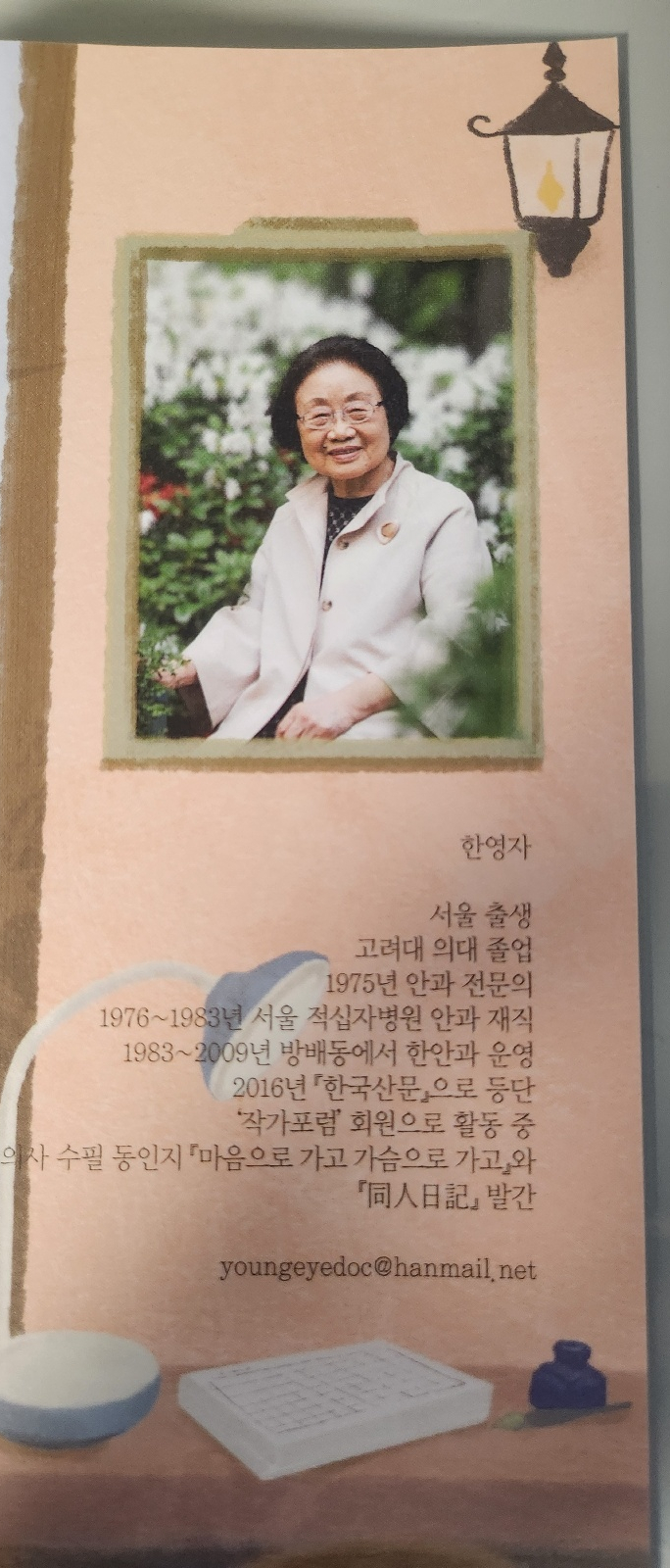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행의 사고 / 윤여일 (0) | 2024.07.01 |
|---|---|
| 허송세월 / 김훈 (0) | 2024.06.28 |
| 초예측 / 유발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외 (0) | 2024.06.17 |
| 책 읽기는 귀찮지만 독서는 해야하는 너에게 / 김경민 • 김비주 (0) | 2024.06.14 |
| 꽃잎 한 장처럼 / 이해인 (0) | 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