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석 시인 63년생, 회갑이다. 다시 한 살이라고 한다.
시인 이력 35년에 다섯 번째 시집이다. <검은눈 자작나무>를 만난 게 벌써 5년 전이다.
6년 전 <The 수필>을 만들며 출판사 대표로 만난 그는 스스로 '일머리'가 있어서 몸으로 하는 일을 잘 한다고 했다. 일머리 없는 사람과 사는 나는 경이롭게 바라봤다. 늘 웃는 얼굴이다. 씩씩하다.
아침마다 일산 호수공원 '닥치고 걷기'를 한 후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페이스북에 하루를 연다. 황당한 뉴스는 시인을 화나게 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나는 반갑다는 인사로 '좋아요'를 슬며시 누른다. 시 <동짓날 금요일> 에 그의 일상이 훤히 그려진다.
이번 시집은 명료하다. 이렇게 단방에 다가오는 시가 좋다. 단숨에 읽었다.
특히 4부 가족사를 다룬 시에서 몇 번 울컥, 했다. 진정성 이상의 수사는 없다. 자주 들춰볼 것이다.
시인이 더욱 맑고 고요하게, 그러면서 힘차게 나아가리라 믿는다.
* 차마고도 외전(外傳)
그렇구나, 걸을수록 멀어지고
오를수록 오늘의 끝으로 다가가는
깎아지른 빌딩의 그림자 꼿꼿한 도시
자신을 되비치는 유리창 벽들 빛나고
또 빛나는 길이 시작하고 끝나는
인도 앞과 뒤와 옆, 또 그 앞과 뒤와 옆
그 어디고 천 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니
무작정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
뒤를 돌아보는 후회 따위는 남기지 말고
아하, 추락은 가능해도
상승이나 횡단과 추월은 허용되지 않는
어떤 것도 그림자 남기지 못하는
금빛 햇살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바람마저 툭툭 끊겨 가쁜 숨소리
메아리로 되돌아오는 도시 한복판
백척간두, 아찔한 빌딩 꼭대기
발가락 닳고 짓물러 뭉개지기 전에
도착한 어느 곳
그저 삼보일배 고행을 강요하는데
걸음은 결코 더디어지지 않는다
벼랑이다 걸을수록 기어갈수록
멀어진 세상과 가까워지는
허공에 발 딛듯 안전하게 걸어야 한다
* 부석사
해 넘어가는
맞은편 산등성이에 걸린 풍경 風磬
한 줄기 바람 없이 흔들리지 않아도
… 무겁지
… 무겁지
… 무겁지
두 손 모아 허리 구부리고
무릎 꺾고 두 손 하늘 받들며
더욱 아래로 더 더 아래로
그 역순으로 땀 뻘뻘 흘리며
삼천 배를 하는 사이에도
끊이지 않게 짓누르는 소리
… 무겁지
… 무겁지
… 무겁지
그것 봐!
부석 앞에 후들거리며 설 때
번쩍 드는 한생각
저 무거운 바위
언제부터 허공에 떠 있었을까
천근만근 근심
툭, 던져놓고
* 첼로 듣는 아침
벌써 시작이다
이른 새벽부터 무에 그리 불만인지
낮은 소리로 구시렁거리는
오랜만에 늦잠 자는 칼귀에
덕지덕지 걸리는 어머니 잔소리
새벽 5시면 절로 켜지는 라디오
더 깊이 잠들려 애써도
무의식 속으로 깊숙하게 파고들어
돌아가신 지 사반세기 지나도
내내 마음 아프게 하는,
* 주렁주렁 아카시아
지금 그녀는 여기 없다
백일 전쯤 늦은 저녁 먹다 갑자기 쓰러져
목젖 부근 구멍을 뚫어 산소를 불어넣었다
몇 날 며칠 간이 침대에 붙어서 밤을 지새웠다
넓디넓은 등 흐무러지고 욕창이라도 생길까봐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구석구석 물수건으로 훔쳐낸다
몽롱한 알코올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끝마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이라 여기던 한 대학병원 정문을 나설 때
아득함이 바로 이런 것, 쏟아지는 노란 햇빛이
전부 벼랑이란 걸 알았다
산 너머부터 날아온 아카시아 꽃잎 싸락눈처럼 뿌려졌다
그날 이후 꿈에서조차 나타나지 않는 그녀, 지금 여기 없다
가끔 취해 찾아가는 구파발 쪽 북한산 자락
그날처럼 아카시아꽃들 향기 연신 뿜어내고
하얀 뼛가루 몇 줌씩 바람 속에 던져주는 아카시아
비틀거리며 내려온 해 지는 길거리
바람 불 때마다 스스스 함께 울부짖던 아카시아
해마다 오월이면 그녀의 젖가슴 더듬듯 찾아가
주렁주렁 달린 너를 물끄러미 본다
조 대표는 시집을 건네며 "시보다 해설이 좋아요" 한다.
평소에 잘 읽지 않는 해설까지 연신 끄덕이며 읽었다.
- ... 그의 시는 마침내 '자연'으로 돌아왔다. ... 그의 시가 '도시적 서정'에서 '전통적 서정'으로 변했다. 뿐만 아니라 시의 형식도 눈에 띄게 단아해졌다. 시세계가 변하다 보니 시형식도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나는 비판의 치열함보다는 홍오의 공감 쪽에 설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시란 '잘 표현된 아픔'이라고 믿으니까. 시인의 아픔에 대한 공가민나 이해 없이 아찌 그 시인의 시를 평가하겠는가.
- 김남호 / 시인,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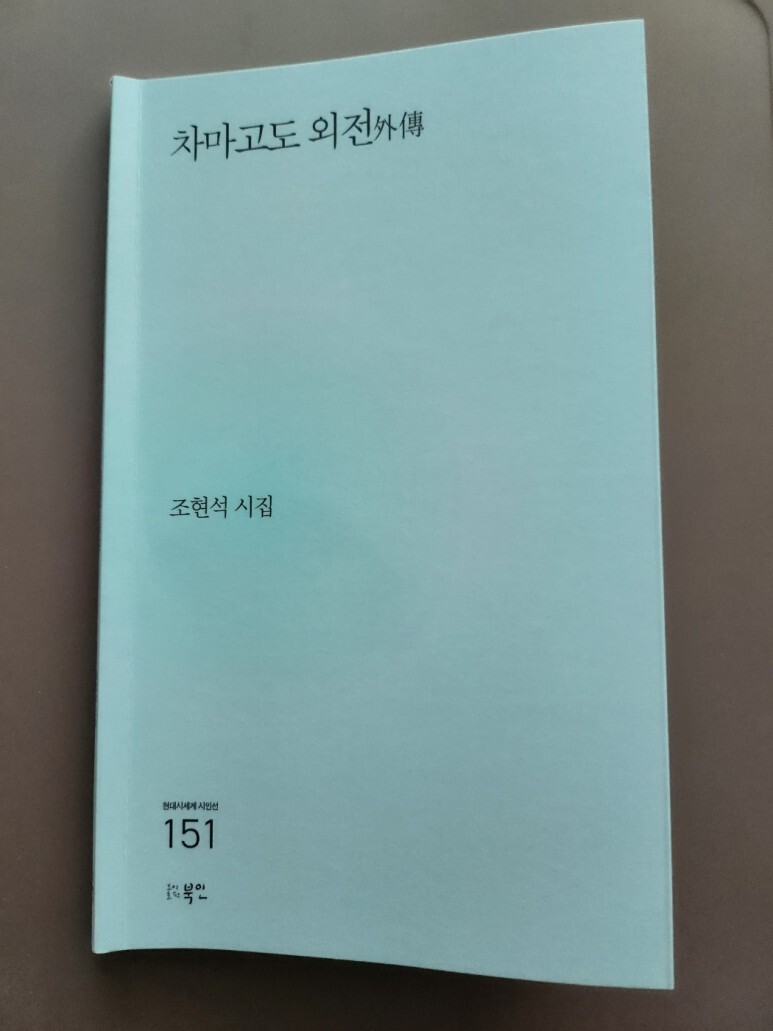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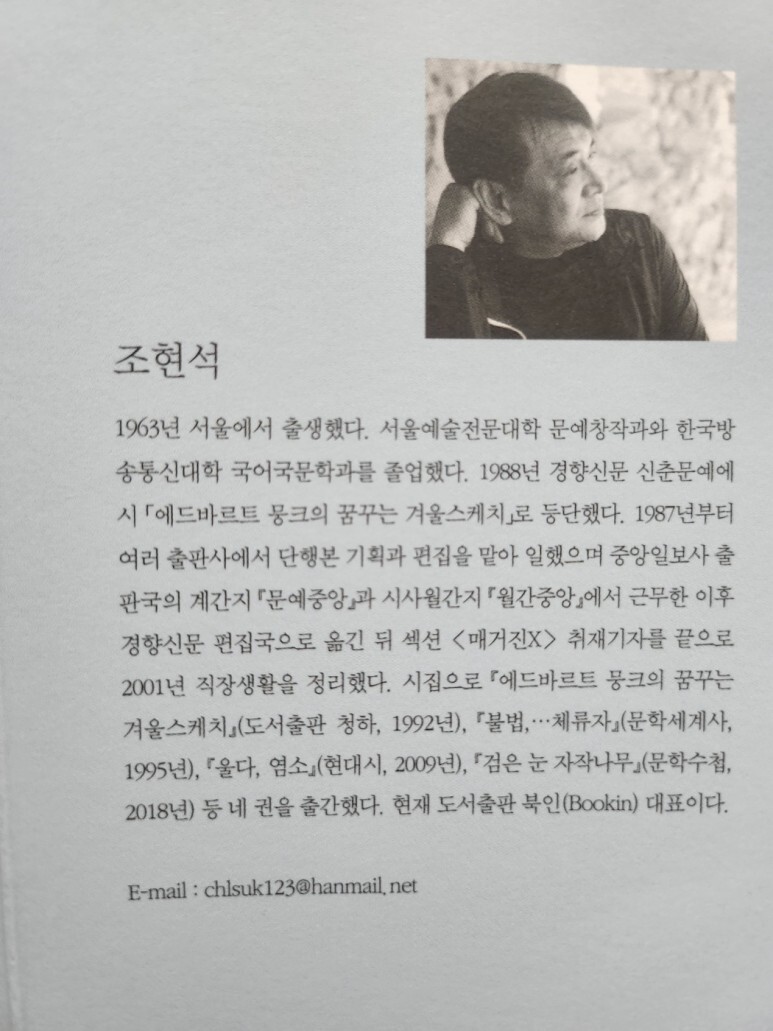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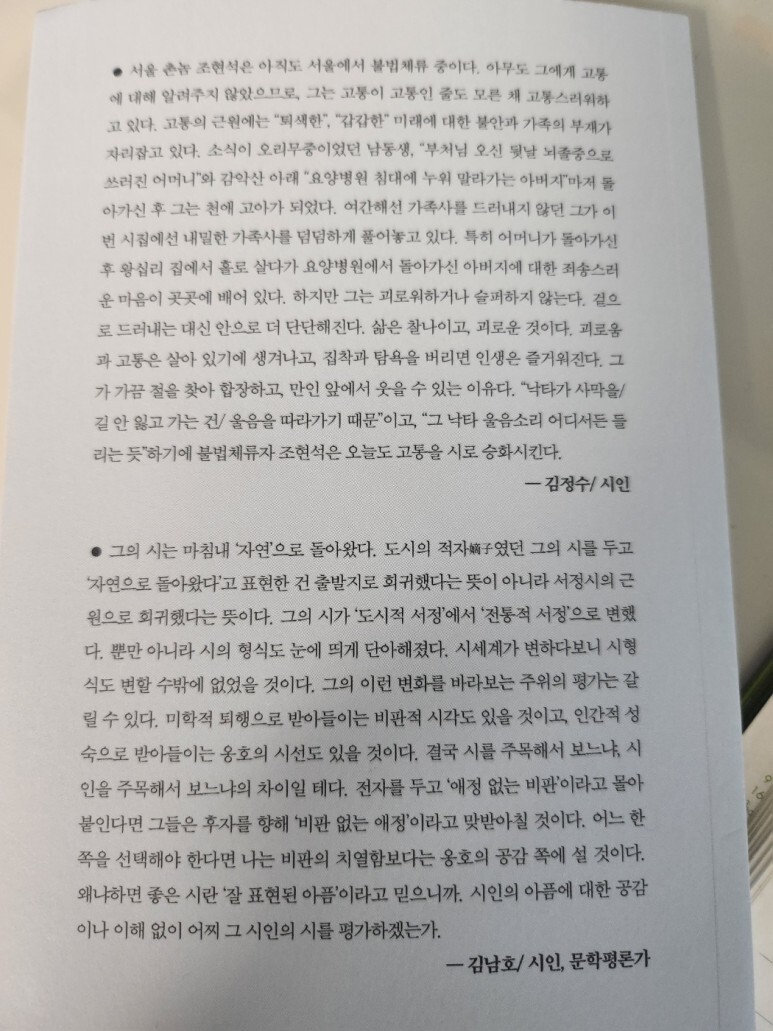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 / 박설희 (0) | 2023.09.16 |
|---|---|
| 진보적 글쓰기 / 김갑수 (0) | 2023.09.11 |
| 백권대학 / 김갑수 (0) | 2023.08.21 |
| 대문 바깥 / 이부림 (0) | 2023.08.14 |
| 반 한 칸의 우주 / 박기숙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