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 선생의 세 번째 수필집이다.
첫 작품이 <사랑이 답이다> 내가 청탁했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특집 원고다. 하여 더 반갑다.
작품마다 훤히 그려지는 이야기를 주축으로 말미에는 선현의 지혜까지 알려준다. 불교경전도 재미있게 풀어내니 쉽게 다가온다. 쉽게 읽히지만 내 습성대로 후르륵 읽지 않고 아껴 읽었다.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이 내 일인듯 다가온다. 교직에서 만난 학생들과 동료 이야기며 길에서 만난 사람을 대하는 모습까지. 그저 고개가 숙여진다.
수필은 인간학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다.
*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안다."
소설 《미국의 목가》에서 목청을 높인 작가 필립 로스의 뾰족하고 서글픈 지적이 못내 가슴을 휘저었다.
내미는 선배의 거친 손을 잡으며, 어림쳐 짐작하고 모면할 핑계에 몰두했던 나 자신이 얼마나 헤식은 사람인지 진심으로 창피했다. 선배가 건넨 고추장 단지가 묵직하다. (59쪽)
내가 좋아하는 '필립 로스'도 반갑다. 그의 시니컬한 어조가 생생하다.
아버지 간호를 하며 쓴 <애기똥풀> 를 읽으며 필립 로스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록한 《아버지의 유산》이 떠오른다.
선배에 대한 솔직한 마음에 아슬아슬하다가 함께 가슴을 쓸어내렸다.
* 두 손을 모아 빠르게 비벼 따뜻하게 만든다. 그 손을 두 눈에 대고 부드럽게 비빈다. 손바닥을 떼며 천천히 눈을 뜬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몸을 편히 푼다. 문득 맑은 숲의 솔향기가 코끝을 스친다.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 정신이 명료해진다.
이렇듯 나는 매일 아침 솔숲에 다녀온다. (83쪽)
표제작이다. 아침 마다 명상을 하며 솔숲에 다녀오는 건 대단한 경지다. 내가 하는 국선도에도 저런 동작이 있는데... 솔향기라니 내겐 어림없는 일이다.
*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것도 모르냐'고 몰아세우면 안 되네. 이것저것 모두 알면 왜 자네한테 와서 배우겠나? 누구에게든 따뜻하게 대해 눈 흘기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야. 꼭 명심하면 좋겠네!"
어머니의 뜻이 도탑고 이치가 정연해 반드시 지키리라 속다짐했다. 하지만 불과 삼 년도 되지 않아 그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다.
......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드러남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의 깊이'라고 했다. 드러내 보일 것이 없는데 깊숙한 곳에 감춰둔 깊이가 어디 있었겠는가.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되짚어 볼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다시금 큰 스승 어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인다. (135쪽)
* 세상은 불합리와 우연으로 가득하다. 누구에게도 길을 가다가 칼에 찔리거나 보도블록으로 맞을 만한, 성폭행을 당할 만한, 더욱이 살해당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텅 빈 무대, 황량한 언덕과 쓸쓸한 나무 한 그루.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지루한 기다림은 멈출 수 있을까. 더 나은 세상,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은 과연 있을까.
세상은 참 불가해한 어둡고 깊은 숲길이다. (148쪽)
* "늙음을 잊으면 노망이 든 것이요. 늙음을 탄식하면 추한 것이다."
<낙치설落齒說>을 써 나이 든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한 조선 후기 성리학자 김창흡의 날카로운 일갈이다. 무겁고 서늘하게 우리를 일깨운다. ......
담담하고 고분고분 늙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초연하고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예나 지금이나 불로초는 없다. (2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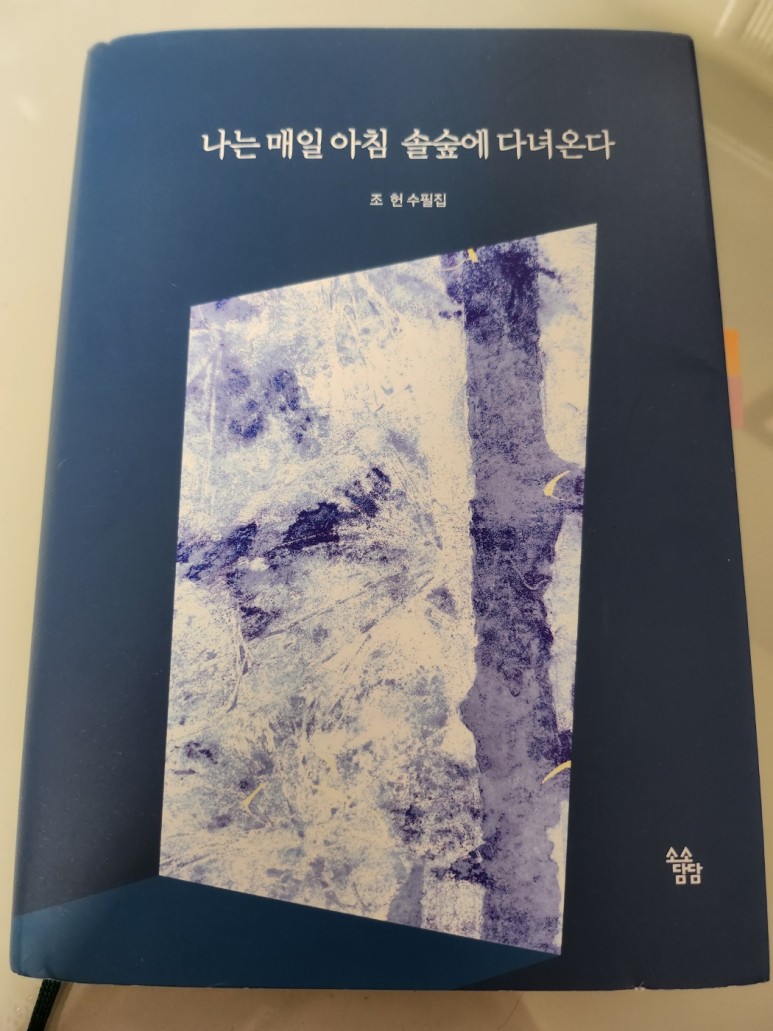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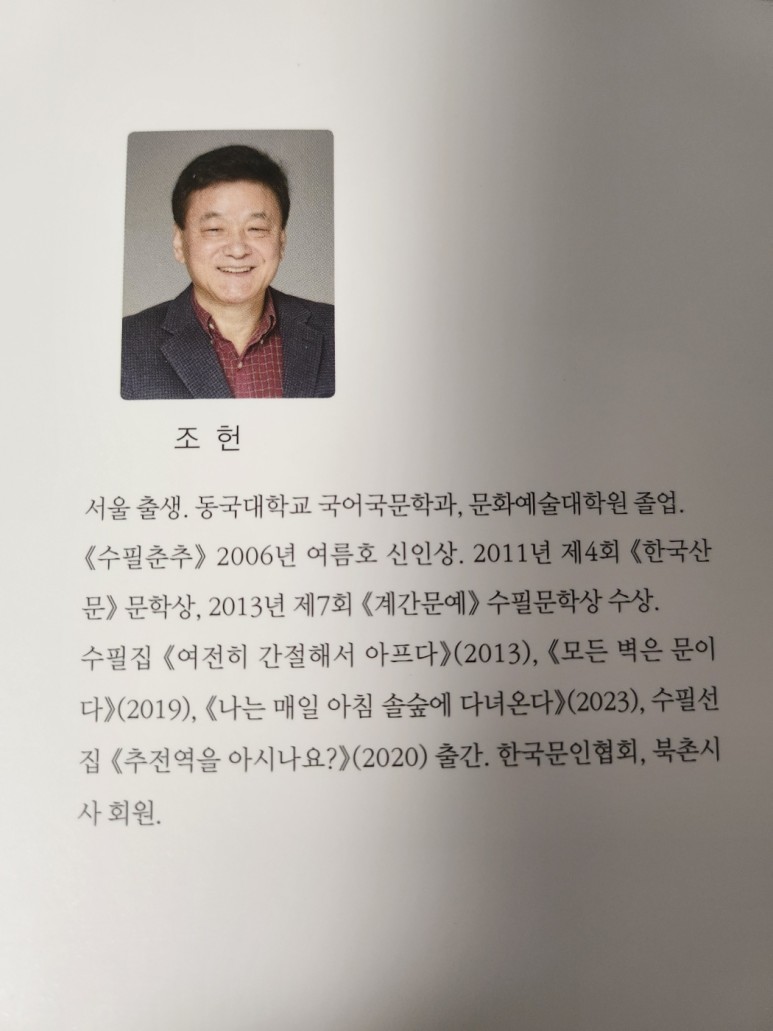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사람을 기른 어머니 / 고경숙 (0) | 2024.03.08 |
|---|---|
| 달리지 馬 / 오봉옥 웹툰시집 (0) | 2024.03.01 |
| 이 여사의 행복카페 / 이영옥 (0) | 2024.01.27 |
| 교양인의 서양건축사 / 이민정 (0) | 2024.01.25 |
| 상처로 숨 쉬는 법 / 김진영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