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설을 수필로 읽는 버릇이 있다.
최근에 카뮈와 헤세를 읽으면서도 그들의 생애를 더듬는 걸 보니 습관이 되어버린 듯도 하다.
어이없게 '작가의 말'을 읽으며 두 편으로 나누면 좋을 수필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8편 단편소설이 그만큼 현실감 있게 읽힌다.
박수보낸다.
<그랑블루>
* 수중에서 온종일 흐느적거리는 꼬리가 저려서 견딜 수 없을 때 나는 무도회장을 찾아갔다. 무도회장에서 그를 만났던 날, 그는 입구에서 수줍게 서 있던 나를 이끌고 사방이 거울로 된, 그래서 몇 배 더 넓어 보이는 무도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어지러웠다.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음악에 맞춰 얼굴을 마주 보며 손을 잡고 함께 스텝을 맞춘다는건 얼마나 은밀한 대화인가. (30쪽)
아쿠아리스트 여자는 외롭다. 어룽거리는 물속을 배경으로 그의 쓸쓸한 마음이 춥다.
오래전 대부님께 들은 춤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마릴린 먼로가 좋아>
*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말문이 막혀 끊기고 정 안 되면 실눈을 뜨고 살포시 웃으며 마무리를 지었다. 어느새 여자 동기들은 그녀가 안 보는 데선 그녀를 백치미의 대명사인 마릴린 먼로라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역사교육을 전공한다는 건 불가사의라고 하면서 뒤말들을 했다. (41쪽)
*그녀를 찾으러 시선을 멀리 두며 광장을 돌았다. 예배를 드리는 무리 반대편에서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인을 보는 순간 그녀라는 느낌에 섬뜩했다. 그녀는 자꾸 치켜 올라가는 하얀색 플레어스커트를 잡고 있었다. 그곳은 환풍구 위였다. 뭔가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헤죽헤죽 웃고 있었다. (60)
잘 웃는 마릴린 먼로가 우째 정신줄을 놓았는가. '결혼은 미친짓이다'를 떠올려야 하나.
<프랑스어 연극처럼>
* 살짝 열린 출입구 문틈으로 들어온 오후의 햇빛이 어두운 '몽마르트' 지하카페 계단 위로 흘러내렸다. 어느새 총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빛이 총구에 닿아 번쩍였다. 나는 총으로 안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뫼르소가 아랍인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테이블에 책을 내려놓으며 와락 울음을 쏟았다.
(86쪽)
안은 뫼르소보다 총을 맞을 만 했다. 내가 아는 프랑스 영화처럼 슬픔마저 멜랑콜리하다.
<새벽에 사과 먹는 여자>
* 나는 C가 깨어나길 바라면서 있는 힘껏 베어 물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사과를 나는 C에게 권할 것이다. 이 사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금가지는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C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일 것이다.
C는 내 마음속 생각을 듣기라도 한 것일까? 어느새 일어나 남은 한 개의 사고를 마저 들고는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렸다. 소년의 머리 위에 놓이 빌헬름 텔의 사과가 떠올라 나는 순간 비장해졌다. (96쪽)
* 종을 세 번 울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나는 지난밤 꿈속에서 사과와 함께 둥실 날아오르던 것을 떠올리며 줄을 잡아당겼다. 소리가 퍼져 날았다. 사방에서 사과가 날아올라 흩어졌다. 나는 단물이 가득 고인 윤기나는 그 사과가 엄마에게, 또 어디엔가 있을 이모에게도 가서 안기기를 소원하면서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111쪽)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드브로부니크... 동유럽 페키지 여행을 따라가는 풍경이 눈에 선하다.
난 새벽에 일어나 동네 성당 안에 있는 이쁜 묘지를 찾았는데....
<K네집>
* K가 집 앞에 나와 있었다. 담장은 없었고 그 집의 표식인 양 묶여 있는 커다란 개가 짖지도 않고 눈만 끔뻑였다.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나무 데크에는 미리 준비해놓은 장작불이 타고 있었다. 3월 초의 날씨는 스산했고 난로 속에서 타오르느는 붉은 불빛이 긴장된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189쪽)
* K는 쫓아오는 뒤차의 상황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똑바로 나아갔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움을 향해 곧바로 질주했을 K의 지금까지의 여정이 보이는 듯 했다. (207쪽)
추억은 추억으로... 설렘이 솟구칠 일 없는 일상에 안도한다. 살짝 쌉쌀하며.
- 뒤표지에서
의미심장하고도 재미있는 소설이다. 독일 신고전주의를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이 소설가의 공부의 깊이를 말해준다. 이즈음 우리 소설은 새로운 모색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나, 앞날은 모호하기만 하다. 다만 이 소설같이 정도를 지키는 문학을 보여주는 소설가가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윤후명)
반가운 윤후명 소설가, 유재용 선생님이 생각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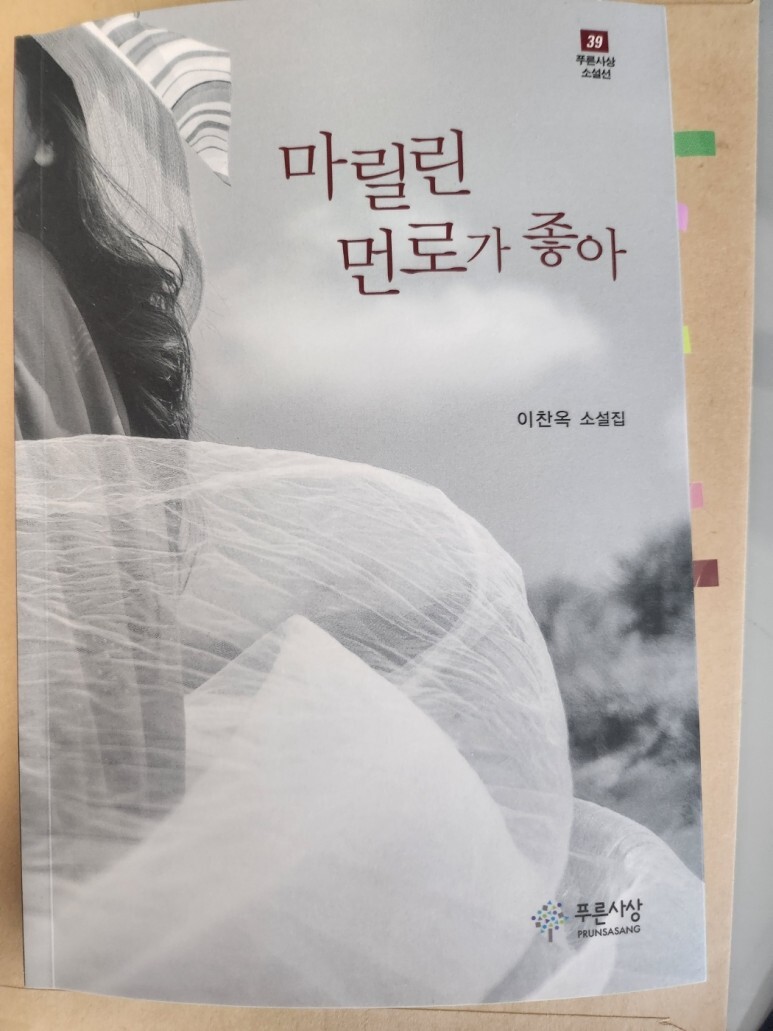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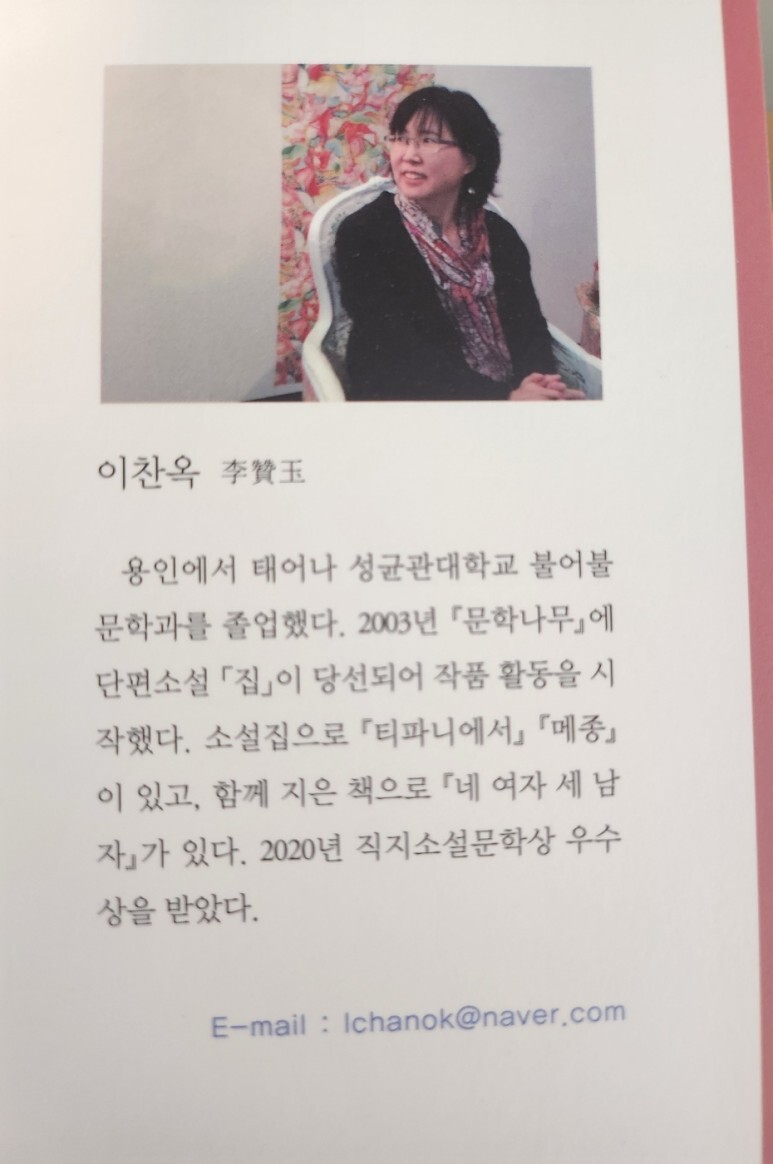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탁환의 원고지 / 김탁환 (0) | 2023.05.07 |
|---|---|
| 바람의 말 / 최현숙 (0) | 2023.04.17 |
| 공부론 / 김영민 (3) | 2023.04.06 |
| 문도선행록 / 김미루 (0) | 2023.04.02 |
| 헤르만 헤세 시집 / 헤르만 헤세 시. 그림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