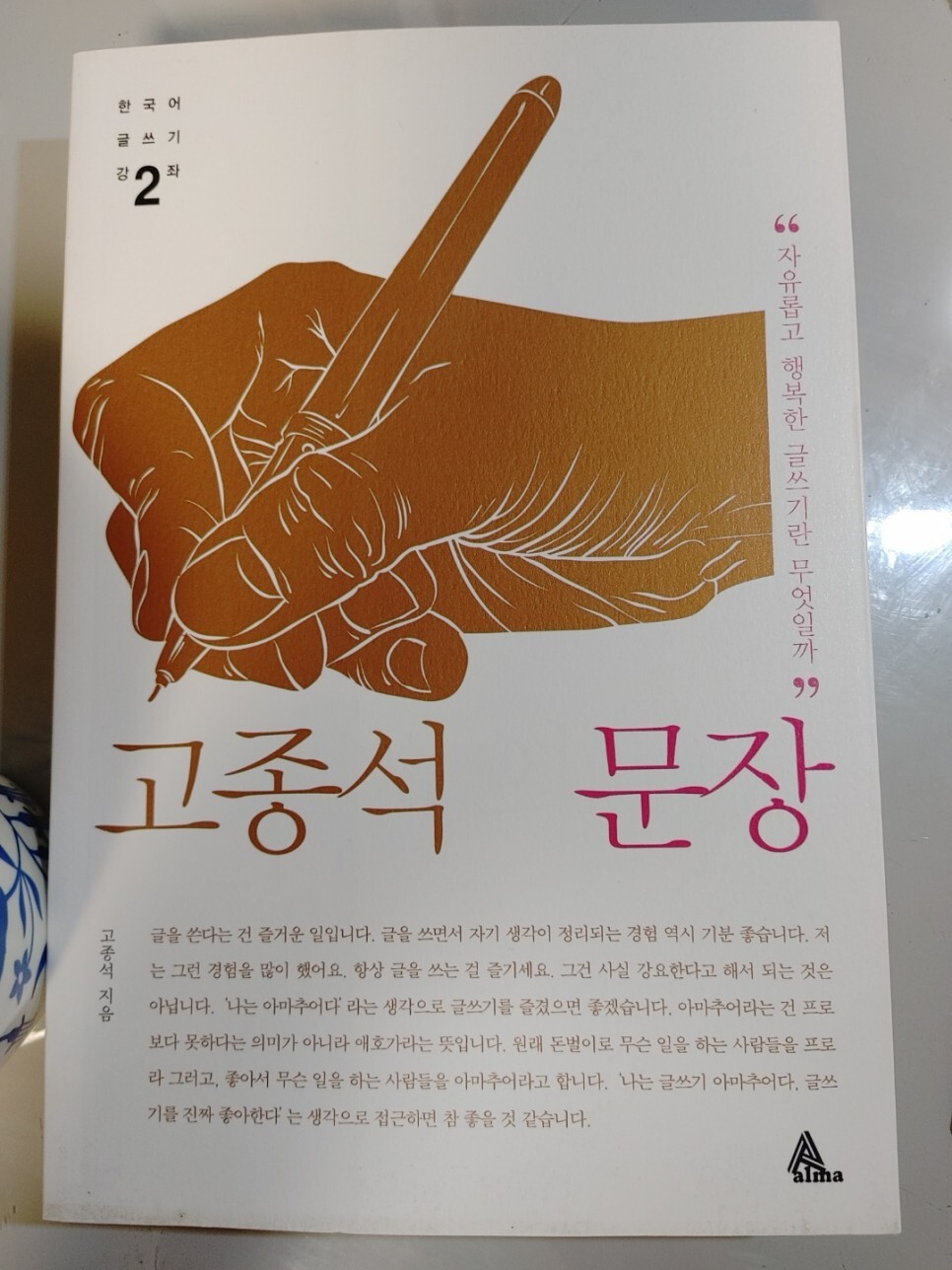
* 양주동: 독보적 문체를 통한 구별짓기
호가 무애인 양주동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국문학자로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신라향가와 고려가요 연구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옛 노래들을 연구해서 낸 학술저서가 딱 두 권이에요. <조선고가연구>랑 <여요전주>. 앞엣것이 향가에 대한 연구서이고, 뒤엣것이 고려가요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둘 다 매우 두꺼운 책입니다.
이분은 이 책 두 권만 쓰시고 학술 연구는 그냥 내려놓다시피 했습니다. '난 공부할 건 다했다. 이제 술이나 마시고 살아야지. 술이나 마시며 잡문이나 쓰면서 살아야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주 반생기> <인생잡기> 이런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일제 때는 시도 쓰셔서 <조선의 맥박>이란 시집도 내셨는데, 제가 외람되게 평가하자면 시인으로서는 뛰어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문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 내기 힘들 만큼 독도적인 한문체 스타일이에요. (122쪽)
나는 양주동 선생을 아는 세대다. 윤재천 선생으로 부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스스로 '국보'라 칭하시며 거침없이 살다 간 분이다.
* 피천득 : 어느 스타일리스트의 치명적 한계
피천득이라는 유명한 수필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필문학 하면 피천득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평판이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분 수필 한두 편은 읽어봤을 거에요. 장수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거의 백수하신 것 같아요. ...
그런데 흔히 한국말로는 에세이를 그냥 수필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에세이라고 말하는 건 대개 아주 심각한 글입니다. 에세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몽테뉴의 <에세> 자체가 그렇죠. ...
한국사람들이 보통 수필이라고 말하는 건 미셀러니, 경수필입니다. 피천득 선생이 쓴 글들도 에세이가 아닌 미셀러니 범주에 속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이분이 쓴 <인연>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어요. 필자가 지인의 딸인 아사코라는 일본 여자와 자신의 인연을 그린 글입니다. 세 번의 만남과 헤어짐의 기억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아사코가 소학교 1학년일 때 한 번, 영문과 대학원생일 때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녀가 결혼을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10여 년 간격으로 필자가 아사코와 만납니다.
필자는 세 번째 만남에서 아사코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 남편이 미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모습에 실망하며 애틋한 마음을 담담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어린 시절)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 이것은 글쓴이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스스로 폭로한 거예요. 자기자신의 헐벗은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죠. 내면의 천박함,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역사나 사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드러낸 겁니다. 아니, 전쟁이 뭐가 좋다고, 그것도 10 먼저 터져야 하나요? 두 남녀를 맺어주기 위해 전쟁이 10년 먼저 터져야 하다니요.
피천득 선생은 잘 알려진 스타일리스트입니다. 테크닉이 뛰어나고 지기 스타일을 확립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타일에서 일가를 이뤘다 해도 그 내용이 천박하면 좋은 글이라 할 수 없습니다. 꼬마 때 읽으면 "와, 이분 글 잘 쓰네" 하겠지만 조금만 크면 바로 알게 되죠. "그 메마른 시대, 1920년대에서 1940년대를 이 사람은 저런 헐벗은 내면을 지니고 살았구나" 하고요.
스타일만 가지고는 마음의 천박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올바르고 기품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천박함을 절대 글에서는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127쪽)
이런 독설이라니... 뜨끔하지만 공감한다.
2001년에 현대수필 특강에 피천득 선생을 모셨다. 그때도 연로해서 앉아서 하시라니까 한 시간 넘게 꼬박 서서 말씀하셨다.
가까이서 본 느낌은 '아기' 같았다. 왜소한 몸에 해맑은 얼굴, 특히 웃을때 아기 같았다. 딸 서영이 두고 간 인형 난영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쉽게 떠올랐다.
피천득 선생이 젊은 때 이광수 선생 집에서 기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광수 선생의 친일 행각이 거론될 때 , 그때 감옥에서 나오지 않은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 요새 교도소 안에서 집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1980년대에는 안 그랬어요. 사실 이게 정말 야만적인 관습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고대에 감옥 안에서도 글을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쓴 글이 나중에 명저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돌아가신 시인 김남주 선생이 <그랬었구나>라는 옥중 시에서 환기시켰듯, 보예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 그랬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그랬고, 체르니세프스키의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재 신체호 선생의 <조선상고사> 역시 감옥에서 집필됐습니다. (40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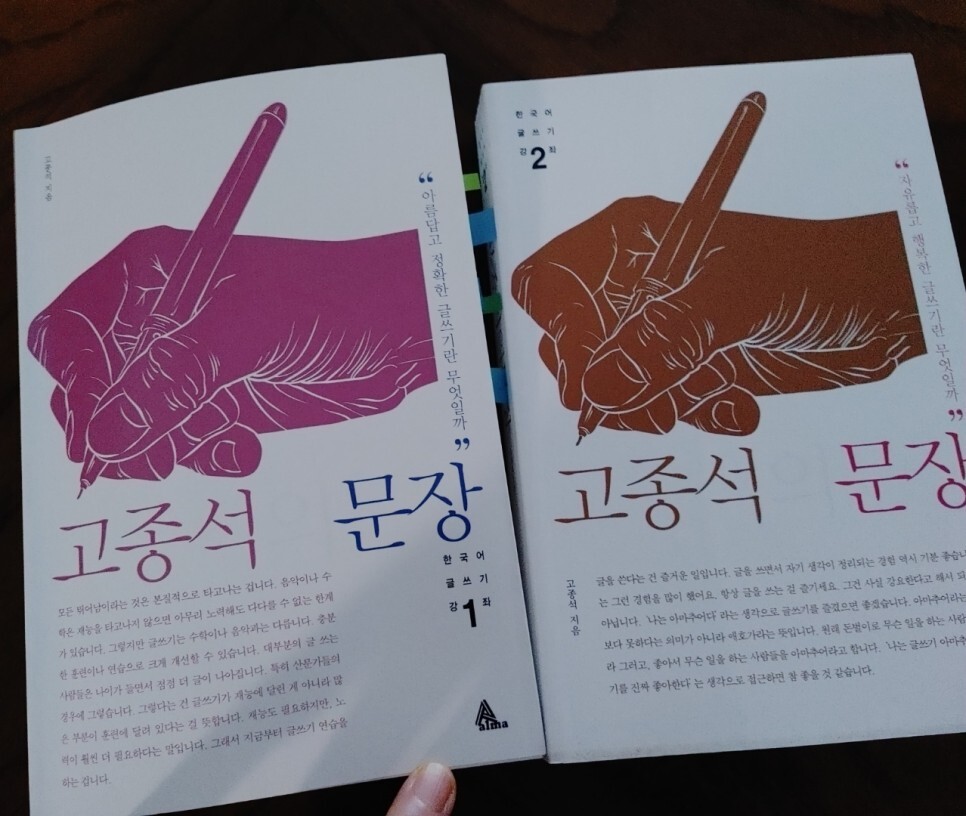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손의 온도는 / 유혜자 (2) | 2022.08.08 |
|---|---|
| 고종석의 문장 1 / 고종석 (2) | 2022.08.01 |
| 작별하지 않는다 / 한 강 (0) | 2022.07.17 |
|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 이윤학 산문집 (0) | 2022.07.14 |
| 저만치 혼자서 / 김훈 (0) | 2022.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