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시력詩歷의 김명리 시인이 그동안 써놓은 산문을 모았다.
'적막이 대들보이고 풀과 꽃과 나무가 서까래인 산골집에서 겨울 고라니에게는 풋것을, 청설모와 다람쥐와 새들에게는 알곡을, 길고양이들에게는 잠자리와 사료와 비린 것을 내어주며 산다.'
이 산골에서 생명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산골뿐 아니라 9장의 <네팔에 오면 네팔리가 되어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디서건 작고 여린 생명들의 이름을 부르며 인간과 같은 위치에 둔다.
카트만두, 포카라, 페와호수, 마차푸차레, 파슈파티나트 사원 ... 2006년, 내가 걸었던 곳을 그리며 가슴이 울렁거렸다.
2부 <쉿, 임종중입니다> 죽음을 맞는 과정이 극진하여 삶의 누추를 벗는다.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연민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경애심이 든다.
단정한 매무새가 그려지는 맑은 영혼의 시인이다. 청렬과 낙조, 창연이 새겨질 듯, 그윽해진다.
사마상여는 자신의 붓끝을 입으로 빨아 그것이 삭아서 닳아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문장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고 한다. 외롭고 가파르지만 한 생애 속에서도 비 그친 저녁녘 산그늘이 내리는 듯 청렬淸冽한 문장, 가을 낙조落照와도 같이 아득히 광활하고 접힌 데 없이 창연蒼然한 생각들을 담고 싶었으나 타고난 비재菲才와 게으름으로 궁색하고 수줍은 글들로 채워진 첫 산문집이 되고야 말았으니 돌아보는 마음 되우 낯 뜨겁고 스스로 부끄럽기만 하다. - <머리글> 중에서
* " 노인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생의 승리"라는 마르케스의 말은 옳다. 여덟 해째 진행성 치매를 알고 있는 엄마지만 아직은 당신의 자식들, 손주들 또렷이 알아보시고 사계의 저마다 다른 바람소리, 봄 나비 떼 같은 심금의 기억들만은 금강석만큼이나 단단해 보인다. (60쪽)
* 『머나먼 쏭바강』의 박영한이 머나먼 곳으로 떠나기 직전 병상의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한 "문학, 그거 암보다 더 고통스러워!" 라는 말이 가슴에 파고드는 요즈음이다. (105쪽)
*격절隔絶의 상태에 놓이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하는 병이 도졌다. 사이토 마리고의 시구를 빌리자면 "땅에다 깊이 뿌리박으면서 하늘을 날고 싶은 병"일 수도 있겠다. 깊은 밤 차를 몰고 천변으로 가 수동이(건강원 창살을 뚫고 탈출한 개)와 길공양이들 밥 한 끼 살펴주는 것 외 대부분의 시간을, 어질머리까지를 집 안에, 책상 앞에 붙박아두고 있다. (136쪽)
* 담푸스에 머물 때 잠시 스쳤을 뿐인 한 여인의 미소가 때때로 떠올라온다. 무겁디무더운 등짐을 지고 길을 재촉하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어찌나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던지. 가는 사람 불러 세워 사진 한 장 찍어도 되겠느냐 물으니 등짐진 그대로 멈춰서서는 볼우물 가득 환한 웃음을 머금었었다.
네팔에서 머물었던 석 달 동안의 기억이 그 여인의미소, 그 여인의 등짐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다. 그이의 한 줌 미소가 나의 전생이거나 후생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있다. (3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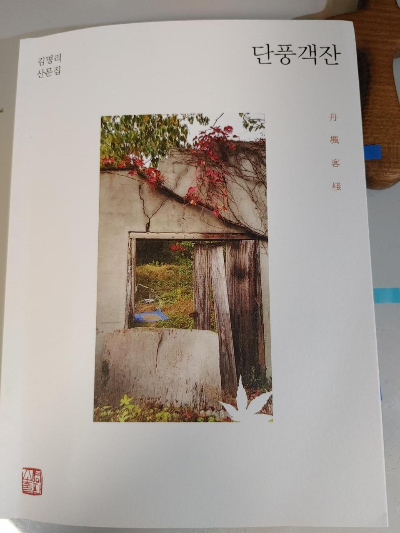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리두기 시대> <25시는 없다> 석현수 (0) | 2021.09.12 |
|---|---|
| 유리멘탈을 위한 심리책 / 미즈시마 히로코 (0) | 2021.09.11 |
| 나는 배웠다 / 유영만 (0) | 2021.08.29 |
| 협력하는 괴짜 - 이민화 (0) | 2021.08.28 |
|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 박완서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