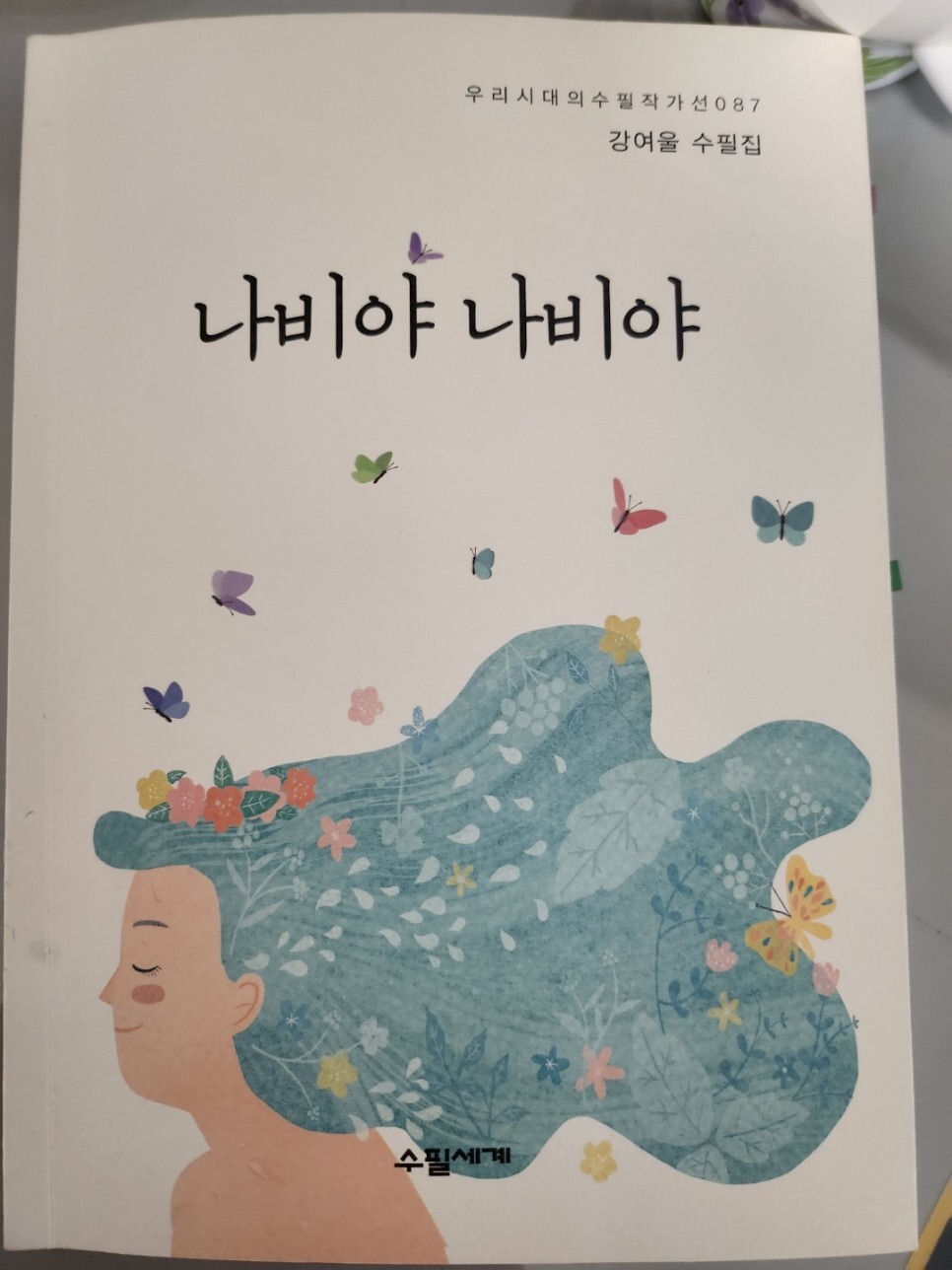강여울 선생은 아주 오래 전, 대구 문학행사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다. 글이 좋아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아주 갸날픈 몸매에 수줍은 모습, 눈빛이 따듯했다. '묵은글이라 부끄럽지만 책갈피에서 떠오른 추억처럼 잠깐 미소지을수 있기를...' 다정한 저자 사인에 가볍게 책을 펼쳤다. 웬걸.. 바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1963년생, 나보다 한참 아래 연배인데 어찌 이렇게 살아냈는가. 장하다. 첫 작품 은 치매 시아버지의 눈길을 따라간다. 외로운 시어머니의 마음을 훤히 뚫고 있다. 삶에 천착해서 풀어내는 게 수필이지만, 보이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에 머무는 게 또 수필이 아닌가. 경계를 넘어선 진솔함에 자주 울컥거리렸다. 아니 경이로움으로 고개를 숙인다. 오랜 '매듭'을 지었으니, 앞으로 가볍게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