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더수필>을 시작하면서 분기별로 만나게 된 이혜연 선생은 늘 건강이 염려스러웠다.
어제 받은 책을 다 읽고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전히 몸이 우위에 있다지만, 내가 염려하던 것보다 강건한 정신에 안도했다. 간간이 보이는 자조에서도 자존이 느껴져 다행이다. 남은 날을 준비하는 마음에 연신 끄덕였다.
내가 아는 작가들과 책이 많이 등장해서 반가웠다. 밑줄 대신 붙이는 포스트잇이 많이 붙었다. 단숨에 읽은 것이 미안할 지경의 공력이다. 거듭 읽으며 공부할 구절이 많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 임영웅에 대한 팬심마저 글쓰기와 연결시키는 당위가 고급지다.
갑자기 내 옆구리가 시리다. 푹빠져 눈물을 흘릴만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건 분명한 결핍이다. 덕분에 흘려버리고 있던 각성을 수습한다.
선생의 '잠재된 행복 솜씨의 씨앗'을 활짝 발아시키길 기원한다.
* 분주했는데, 제자리걸음이다.
생각이 많았는데, 쭉정이다.
움켜쥐었는데, 빈손이다.
머릿속에 공글리고 있을 때가 나았다.
발화 發話하고 나면 늘 부끄럽다.
그래도,
다만 누군가에게 밑줄로 남는 문장 하나 있다면
행복이겠다.
'책을 내며' 중에서
* 불안감에서였을까. 목마름이었을까. 어머니는 다른 여자의 몸에서 얻은 자식인 나를 당신 배 앓아 낳은 자식인 양 애지중지 키우셨다. 집착이다 싶을 만큼 온갖 정성을 쏟았다. ... ...
고난은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내가 일곱 살 되던 해, 서른아홉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금슬 좋은 부부가 사별을 하면 외려 허전함을 견디지 못해 일찍 새 짝을 찾는다더니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일까. 어머니는 얼마 되지 않아 재가를 했다. (25쪽)
* 아버지께서 가셨다.
어느날, 문득, 가셨다.
임종을 예견했지만 그날은 '어느 날'이었고, 숨을 멈춘 순간은 '문득'이었다. 태어남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예정된 날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날은 '어느 날'이었을 것이고, 세상 속으로 고개를 디민 순간은 '문득'이었을 것이다. (59쪽)
* 요절한 작가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루고 간 영롱한 작품들을 보면 심한 자괴감에 빠지기까지 한다.
이런 자괴감을 잠시나마 보류하게 해주는 것은 <조숙早熟>이라는 수필 속 상허 이태준 선생의 말씀이다. 요절한 작가가 이루고 간 성과도 훌륭하지만, 당신은 오래 살아 푹 익은 글을 쓰고 싶다고 했다. 오스카 와일드 또한 오래 살아 예술적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진수를 보여주고 싶다 했다. (152쪽)
* 집수리 후, 수리 전 가졌던 미니멀리즘적 사고에 변화가 생겼다. 산뜻해진 집을 보니 얼마 남지 않은 삶, 갖고 싶었던 것 갖고, 가고 싶었던 곳 가고, 하고 싶었던 일 마음껏 해보는 기쁨을 누리다 가고 싶은, 쾌락주의적 욕망이 일었다. (159쪽)
나는 이 대목이 참 반가웠다. 이런 마음이 수시로 솟아나야 한다.
* 권택영의 말대로 '경험이 다르면 기억이 다르고, 기억이 다르면 인지와 판단이 다르'기에, 또 '경험이 다른 나와 너를 이어주는 것이 언어인데 그 유일한 수단은 몸의 경험만큼 정확하지 않'기에 나는 아무에게도 수필 쓰는 법을 설파하거나 조언을 해줄 수가 없다. (164쪽)
이 구절은 요즘 내가 특히 새길 말이다.
*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예술 창작은 아름다움이라는 종교를 숭배하는 의식에 다름없는 것 아닐까.
(209쪽)
* 미국 공항 세관에게 "신고할 것은 나의 천재성뿐"이라 했던 그의 오만함으로 보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불행히도 그는 끝내 부활하지 못했다. 겸손도 연민도 그의 새 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출옥 후 가톨릭에 귀의하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3년 동안 파리에서 가난과 모멸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46세가 되던 1900년에 뇌수막염으로 생을 마감했다. ...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하는 예술은 허구의 무용한 아름다움이었다. 예술을 메마르게 하고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는 것이 '사실 숭배'라 주장했던 것도, 상상의 부재를 개탄한 <거짓의 쇠락>이라는 글을 쓴 것도 허구와 상상이 그의 예술의 전부였음을 말해준다. (255쪽)
* 쓰는 즐거움, / 지속의 가능성, /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소멸해 가는 손의 또 다른 보복.
-<쓰는 즐거움>중에서
언어의 불명료성이나 오류조차도 자신의 자유 의지로 활용하고, 소멸에 대한 손의 보복이 '끊임없이 글쓰기'라는 전복적 사고를 하는 시인 쉼보르스카, 문학을 향한 그의 저돌적이고 맹렬한 행보에 위축되었던 마음이 웅장해진다. (269쪽)
* 철학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욕망을 없애고 우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살면 고통 없는 상태인 '아타락시아ataraxia'에 이를수 있다는 에피쿠로스의 말을 마음에 새겨본다. (3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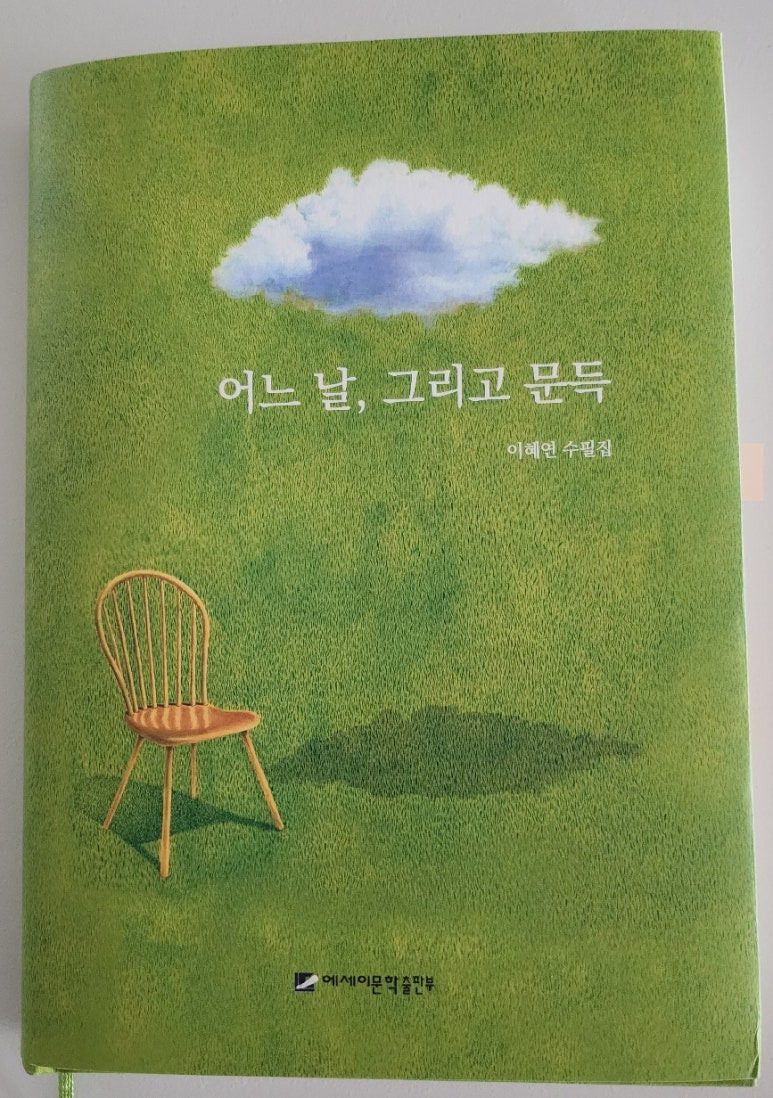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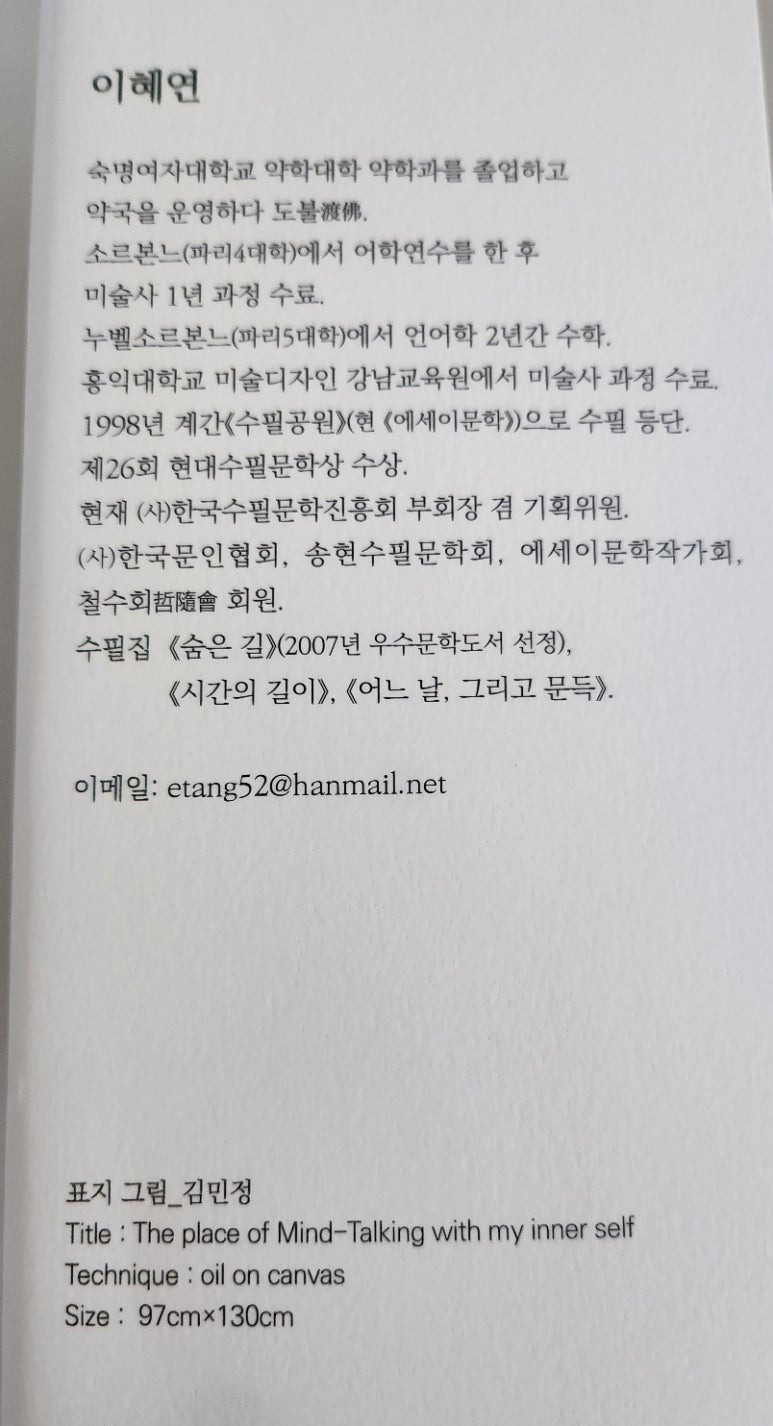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럽에 서 봄- 남프랑스 / 수정 (0) | 2025.04.01 |
|---|---|
| 해류 속의 섬들 / 어네스트 헤밍웨이 (0) | 2025.03.29 |
| 보리누름 축제 / 박인목 (0) | 2025.02.21 |
| 그림자의 강 / 리베카 솔닛 (0) | 2025.02.19 |
| 가문비나무의 노래 / 마틴 슐레스케 (0)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