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처음 알게된 작가다. 내 글이 어딘가에 소개되었는데 평을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했다. 그게 20년도 더 지난 일이다. 그 수필 카페의 쥔장과 함께 인사동에서 만났다. 단정한 모습에 속깊은 눈빛은 글에서의 인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믿음직스러운 작가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들인 작품에 박수를 보낸다.
* 말도 글도 눌변임을 압니다.
이 어리숙함이 성장통이라고 변명하고 싶어지는 날,
용기를 냈습니다.
연필을 깎듯 마음을 깎아 만든 글자들
말의 흰 뼈들
주섬주섬 옷을 입힙니다.
멀리멀리 날아가기를 빕니다.
- '저자의 말' 중에서
* 혼자 서 있다. 시공간을 뛰어넘을 영혼의 그림자 하나쯤 남기게 될 그런 순간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살아남을 화석 같은 글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다. 숱한 작품이 가라앉고 사라지는 순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럴수록 깊은 울림을 건져 올려야 한다. '쉽고, 깊고, 따스한 글'을 쓰고 싶다.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50쪽)
* 살아있는 한, 모든 날은 봄날이다.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눈물로 심은 그 무엇이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다. 이윽고 내 안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베르 쉬르 우아즈에 오길 잘했다. (70쪽)
* 모나리자의 신비한 미소를 밝혀내기 위해 입의 굴곡과 눈 주위의 주름을 관찰해보니 행복 83, 혐오감 9, 두려움 6, 분노 2가 나왔다 한다. 사람이 감정을 수치화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보니 기쁨 83퍼센트와 그 반대의 감정이 뒤섞여서 오묘한 미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거절할 줄 모르는 남편은 그들의 전속 사진사가 된 듯 부주했다.
...
사진은 무로 돌아갔다. 남편의 허탈한 표정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내 안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감출 수 없는 웃음이었다. 사이다를 들이켠 듯 아주 통쾌했다. ... 이번 여행은 좋았다고, 아주 재미있었노라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고거 참, 잘코사니다. (74쪽)
* 보이는 것마다 둥글다. 어쩌다 만난 나무는 좀상좀상하고 모래언덕은 두루뭉술하고, 낙타 등에 올라탄 사람들도 어깨를 둥글게 말고 지나간다. 함부로 각을 세우지 않는다. 부서지고 나눠져서 둥글어지는 걸 배운다. 가까이 있되, 낱낱을 지키기 위해 몸피를 좁히는 것이다. 작지만 단단하고, 가볍지만 빈틈없는 모래알이다. 바람과 햇살이 만든 둥근 경전이다. ( 100쪽)
* 신기하게도 엄나무는 묵을수록 가시를 줄이거나 없앤다. 초식동물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도 될 만큼 몸피가 커지고 키가 높아자면 자신의 날카로움을 덜어낸다. 어울려 사는 데는 까다로운 자기 보호가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는 데다. 기시 대신 줄기를 키워 품을 넓히고, 이파리를 가득 채워 그림자를 늘려간다. 몸을 사릴 때와 풀 때를 아는 지혜겠다.
사람이 지혜는 겨울과 함께 온다. 아픈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자세가 깊어진다면 그 안의 가시는 더 이상 날카로움의 상징이 아니다. (194쪽)
* 기적 소리만 들어도 유리창에 얼굴을 비춰보고, 떨리는 마응느로 철로 쪽을 기웃거리던 시절이 있었다. 철길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차역은 특별한 기호였다. 기다림과 이별의 성소, 그곳에는 아직도 휘발되지 않은 그리움이 남아 있다.
기다림은 세월을 통과하는 힘이다. (2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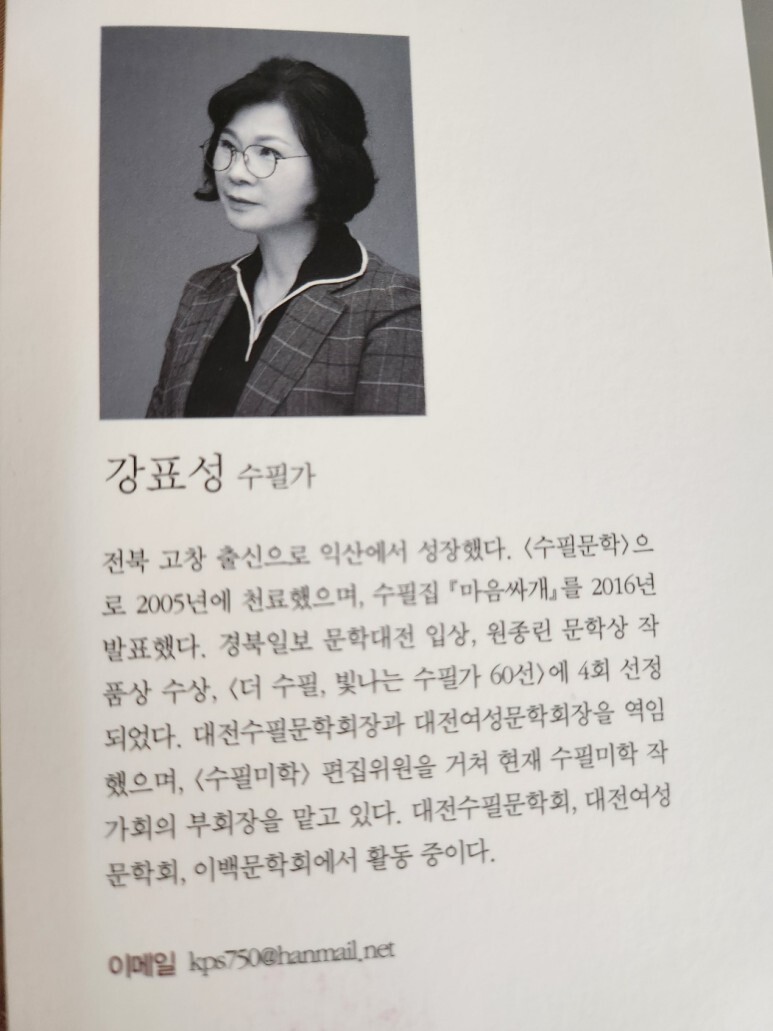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침 그리고 저녁 / 욘 포세 (0) | 2023.10.24 |
|---|---|
| 멜랑콜리아Ⅰ-Ⅱ / 욘 포세 (2) | 2023.10.21 |
| 인간• 철학• 수필 / 철수회 13인의 철학수필• 5 (0) | 2023.10.05 |
| 틈이 있기에 숨결이 나부낀다 / 박설희 (0) | 2023.09.16 |
| 진보적 글쓰기 / 김갑수 (0)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