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단 17년 차 이영희 작가의 첫 수필집이다.
묵은지처럼 깊은 맛이 있다.
오래 전 이지의 『분서』 원문으로 필사했다는 말을 듣고 예사롭지 않았다.
오랜 시간 다졌지만 가뿐하게 정리했다. 솔직 발랄도 하다.
이영희씨에 대한 기억은 유쾌, 통쾌한 유머가 압권이다.
표지그림도 직접 그렸다. 화려한 모습 이면의 수줍은 내면이 얼비친다.
겸손이 지나쳐 자주 숨는다.
이제 다 아팠으니, 앞으로는 훨훨 날개 펼치길 바란다.
박수보낸다.
책을 펴내며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이 남긴 유명한 말, "당신이 읽고 싶은 글이 있는데 아직 쓰인 게 없다면 당신이 써야 한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와 인간의 이기심과 잔인함을 향해 예리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싶기에 저만큼의 단단한 각오를 다졌을 것이다.
나는 어떠했나. 좁은 틀에 갇혀 부모님과 형제, 자식와 남편에 대한 소소하며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골방에 앉아 끙끙대다가 때론 살짝 만족의 미소를 짓다가 노트북을 여닫는 수준이다.
여기 한 권의 수필집을 내며 그래도 작은 욕심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무심코 만난 이 책 안에서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며 한 페이지, 아니 한 구절이라도 너그러이 공감해 준다면 기쁠 것 같다.
-2022년 봄, 이영희 씀
* 그러곤 손님에게 크게 읽어보라고 해요.
비싼 집
안 깎아 주는 집
그러나 확실한 집
정말 소리 내어 크게 읽더라고요.
그때서야 손님은 막 웃어요.
(50쪽)
나도 세 개의 글짓기 방침
읽히게
또 보고 싶게
그리고 생각이 돌게.
(52쪽)
* 마음먹고 늘 책장 저 뒤 칸에서 함부로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래오래 기다려준 고전에 도전해 보았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오묘하면서도 깊고 깊은 그 사유의 끝자락이라도 밟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덕경』 을 석달 만에, 『고문진보』 는 두 달 만에 필사를 한 번씩 마쳤다. 한 번의 베끼기로 하늘과 땅,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좁은 안목을 조금씩 넓혀주는 시간이었음에는 틀림없다. 경전과 고전의 문장 안에서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손에 쥐어진 펜 끝으로 열심히 따라갔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찔끔거리는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고개 들고 아는 척했던 지난날이 부끄러웠다.
(174쪽)
* 수제비와 글제비
밀가루에 적당한 물을 붓고 치댄다.
너무 질지도 너무 땐땐하지도 않게
말랑하지만 탱글탱글한 탄력성.
쉬운 듯해도 결코 단시간에 체득되지 않는
오롯이 손바닥 감각으로만 익혀가는 질감.
글 반죽 또한 다르지 않아 어느 날은
주제가 뭔지 할 말이 뭔지 읽는 이들이 짜증을 내며
휘리릭 다음 사람의 글로 넘어가게 하고
다른 날은 척퍽하게 깊게 길게 숨차게 써 내리지만 무난한 능력일 뿐,
읽고 나면 단순하며 헐겁고 활자들만 힘겹다.
어제저녁에
수제비 반죽을 하며 탱글탱글 전해지는 손맛에
글맛 또한 그러하길 소망하며 치대고 치댔다.
수제비는 아무렇게나 얄핏얄핏 뚝뚝 떼어져
멸치 육수 속에서 팔팔 끓여져 나와도
밀가루 고 특유의 냄새가 살짝 풍긴다. 그 향이 좋다.
소설, 에세이, 시를 짓는 작가들에서 나는
그들만의 체취가 있다.
수제비나 칼국수는 쉬운 음식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단촐한 상차림이지만 반죽부터 육수 만들기
손으로 불 앞에서 하나하나 뜯거나 가지런히 썰어내는
국수발의 정성이 칠첩반상 못지않다.
심심풀이이던 것이 어느새 일이 되고
소일거리가 되었으며
이렇듯 짧은 글제비 맛도 때때로 괜찮다.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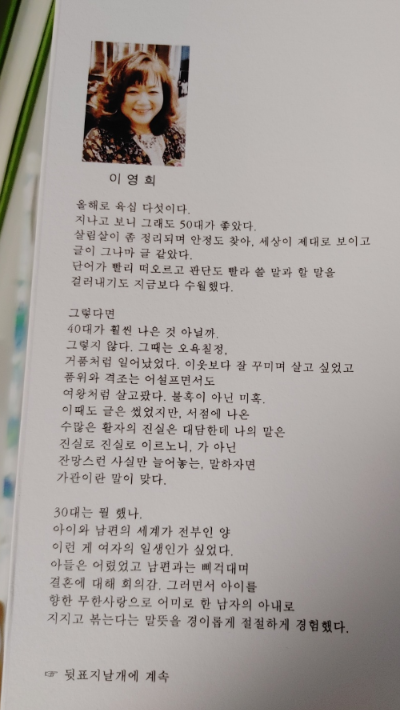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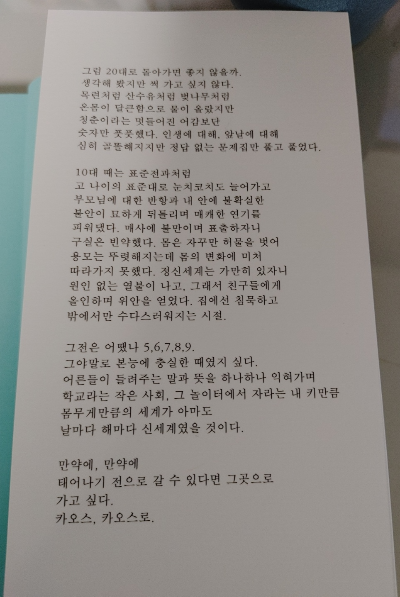
'놀자, 책이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 홀로 간다 / 정승윤 (0) | 2022.06.25 |
|---|---|
| 붉은산 검은피 / 오봉옥 (0) | 2022.06.21 |
| 그늘이 그늘의 손을 잡고 / 노혜숙 포토에세이 (0) | 2022.06.05 |
|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 위화 (0) | 2022.05.27 |
| 끝과 시작 /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0) | 2022.05.21 |